창원 창동의 뒷골목이 새로워졌다. ‘드 세느 아뜰리에’, ‘그랑쇼미에르’ 같은 프랑스어 간판이 곳곳에 눈에 띈다. 여기는 분명 창원인데, 몽마르뜨 언덕에 온 듯한 기분이다. 벽면 곳곳에 사진이, 건물 외벽에는 그림이, 의자 하나 작은 이정표 하나까지 예술의 흔적이 느껴진다.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창동은 6·25 전쟁 때 문화예술인들의 피란지로 ‘경남판 명동’과 다름 없었다. 1980년 초반까지는 마산(창원에 소속되기 전)지역 택시가 창동 덕에 전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번다고 할 정도였으니, 여러모로 전성기임이 분명했다. 그때 당시 창동에는 예술가와 시민들이 찾는 다방과 막걸리집이 많았는데, 그마저도 저녁에는 빈 자리가 없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역의 노후화, 80년대부터 가속화된 창원 신도시 건설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났다. 그 많던 사람이 모두 떠나가고 황량해진 동네, 그곳에는 빈 점포도 곳곳에 나뒹굴었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7월 마산과 진해를 흡수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부터다. 50~60년대 창동 르네상스를 재건하자는 것이 당시의 슬로건이었다. 예술가들이 붐볐던 기억을 복원해, 예술촌을 조성하기로 하고 모든 것을 싹 뜯어고쳤다. 울퉁불퉁하던 보도블록을 모두 걷어내고 옛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황토색 포장길을 새로 냈다. 칙칙했던 건물 담장에 그림꽃이 핀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럼 창동예술촌에는 단지 예술품만 있을까. 아니다, 그를 탄생시키는 작가들도 살고 있다. 힘들게 복원시킨 찬란한 기억 속에 그 문화를 향유하던 주인공이 없으면 속빈 강정이 되고 말테니까. 입주 점포의 임대료를 일주 지원해주는 방안을 중심으로 예술가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예술인과 예술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흘러들었다. 바야흐로 문화 예술을 꽃 피웠던 낭만의 창동 골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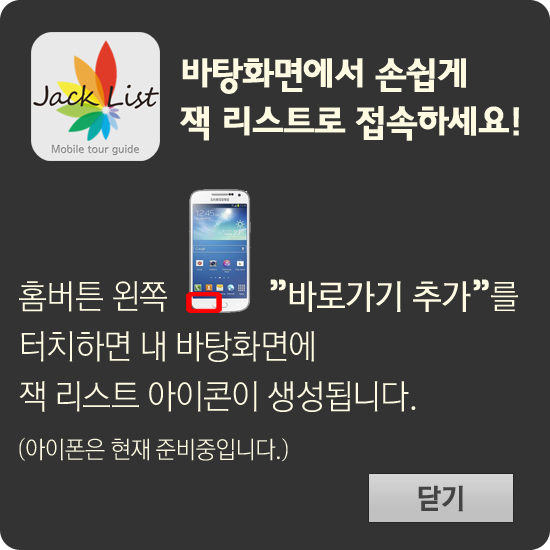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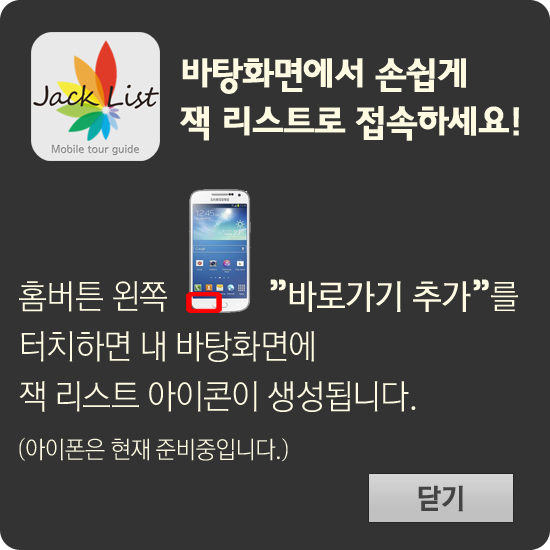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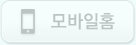

 주소
주소 오시는길
오시는길 한줄정보
한줄정보 상세설명
상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