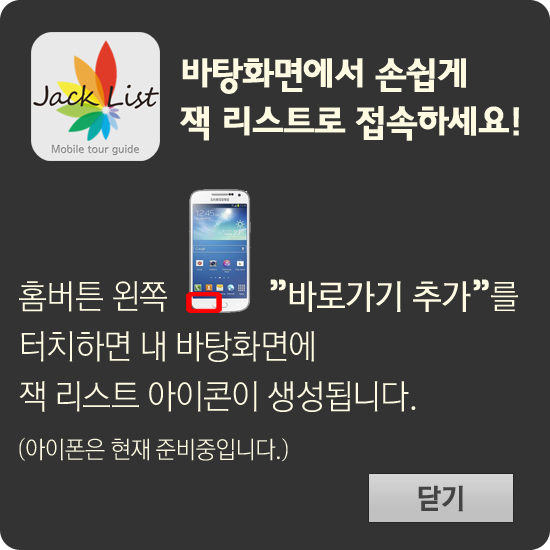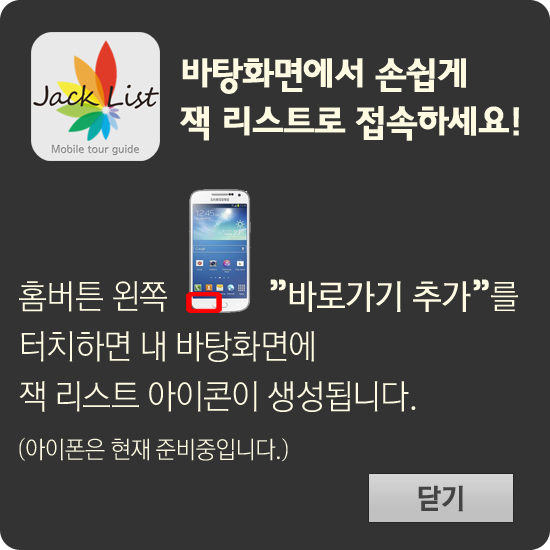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장아찌로 만들어진 명이나물 Ⓒ울릉농업협동조합(http://www.ulleungfood.co.kr/)
뭍 사람들에게는 두 눈이 번쩍 뜨이고 두 귀가 활짝 열릴 만한 잇아이템이다. 고기와 함께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다 하던, 혹자는 남성의 정력에 좋다며 엄지를 추켜세우던, 영양소로 따지면 삼에 비해도 모자라지 않는 고급 채소라던 그 ‘명이’다. 진짜 이름은 산마늘인데 우리들에게는 울릉도의 설화가 가미되면서 생겨난 이름인 ‘명이’가 어쩐지 더 친근하다. 옆집 딸인 듯 엄마 친구의 딸인 것 같기도 한 이름. 산마늘이라 쓰고 명이라 부르는 그 녀석의 맛이 어찌나 신통방통하던지... 울릉도에 두 발을 디디면 가장 먼저 명이를 찾아 양껏 먹고 오라는 지인의 말이 떠오른다.
본래 이름인 산마늘보다 명이가 더 유명해진 까닭은 자생지인 울릉도 설화와 관련이 있다. 이주민이 울릉도를 개척할 당시, 식량이 모자라 산에 올라 눈을 헤치고 명이를 캐어다 먹으며 끼니를 챙겼다. 이 나물을 먹고 이주민들이 생명을 이어갔다 해서 오늘의 ‘명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 일본에서는 수도승이 즐겨 먹는다 해서 행자(行者) 마늘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자양강장에 좋고 맛도 좋아 예부터 애호해 왔다.
명이는 본래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시베리아 벌판, 중국, 일본 등에도 분포하고 있다. 한국에는 신기하게도 울릉도 숲에서만 유일하게 자생하는데, 겨우내 추위를 이기고 자란 명이가 봄이면 산이고 숲이고 지천으로 널려 있어 따로 재배하지는 않았다. 한데 이 명이가 맛과 영양소를 모두 갖춘 궁극의 채소로 인정받게 되면서 타지의 수요가 급증하게 됐다. 명이가 전국적으로 귀해지자 울릉도에서도 따로 재배를 시작했고, 급기야 1994년에는 울릉도에서 반출하여 기후조건이 그나마 비슷한 강원도 고산 지대로까지 옮겨와 키우고 있다.
한데 명이의 맛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본래의 땅에서 벗어난 것이 오리지널에 가까운 맛을 낼 수 있을까. 울릉도의 명이는 강원도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품질이 뛰어나다. 울릉도 명이는 단순히 기후조건이 비슷하다 해서 흉내 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울릉도만의 특별한 자연환경과 기후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 울릉도는 위도상 북쪽에 있지만 난류 영향으로 기후가 대체적으로 온화하다.
해서 바닷가 근처와 달리 울릉도의 숲속은 한반도 남녘땅처럼 따뜻하다. 한데 이 따뜻함에서 그쳤다면 다른 뭍에서 나는 것들과 같았을 터. 울릉도는 겨우내 눈이 내리는 고장이다. 차가운 눈을 머금으며, 바다에서 쉴 새 없이 토해내는 해무 속에서 명이는 서서히 그윽한 향을 피워 올린다. 또 봄날의 극명한 일교차를 통해 명이의 거친 속살은 생선처럼 연해진다.
한줌밖에 안 되는 양에도 몇 만원을 호가하는 명이의 사악한 가격을 보면 선뜻 사기가 망설여지나, 살면서 얼마나 밟게 될 울릉도 땅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좀 더 과감해질 수 있다. 그나마도 울릉도 현지에서 사는 것이 유통단계의 거품을 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독특한 맛과 고유의 향미, 풍부한 무기 성분과 비타민까지 지닌 궁극의 나물 명이, 진정 좋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