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마저 시적인 곳, 바람 가득한 푸릇한 언덕과 그를 떠받치고 있는 쪽빛 바다의 풍광이 어우러져 여행자의 가슴에 잊히지 않는 비경으로 갈무리되는 그곳, 바람의 언덕이다. 해금강 유람선 선착장이 자리한 도장포 작은 항구 오른편으로 낮게 누워 있는 언덕은 그 자체로 자연 방파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언덕 전체가 파란 잔디로 뒤덮인 것이 꼭 제주의 섭지코지를 보는 듯하다. 제주처럼 광활한 초지와 해식애, 기이한 돌들은 없지만 남국의 이국적인 정취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오를수록 더욱 근사하게 터지는 조망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이게 다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이리라.
나무 계단으로 정상까지 연결된 산책로를 따라 언덕을 오르면 몸이 마치 종잇장이라도 된 듯 바람에 사정없이 나부낀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 이제 왜 언덕의 이름이 이토록 시적이었는지 감이 잡힐 거다. 바람이 가득한 곳, 정상에 오르면 마침내 그 바람에 우리네가 정복되고 마는 곳, 바람만이 주인이 되는 곳이기에 이 언덕은 더욱 특별했다.
조금 더 오르니 바다를 내려다보고 선 갈색 풍차가 우뚝 들어선 것이 보인다. 최근에 들인 네덜란드식 풍차로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 네 개의 날개가 바람결 따라 돌아갈 때는 소리가 엄청나다. 영화 <폭풍의 언덕>에는 저택이 덩그러니 있었다면, 바람의 언덕을 지키는 것은 듬직한 풍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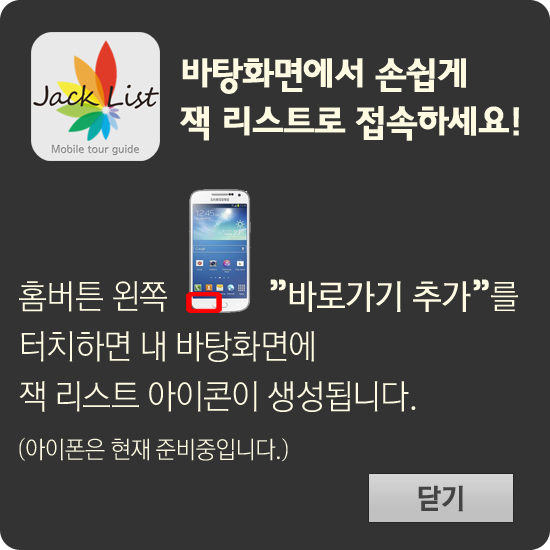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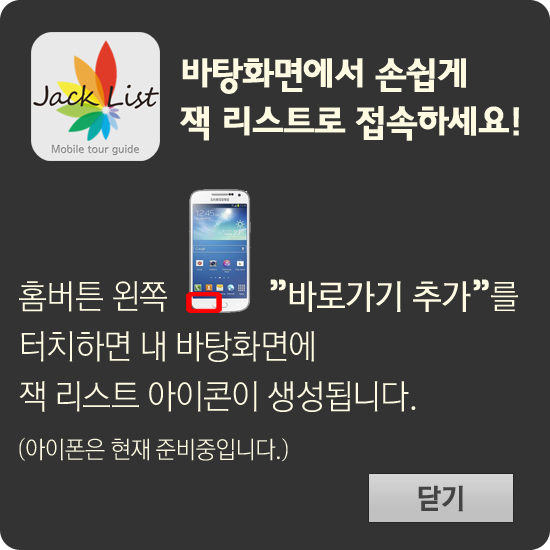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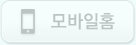

 주소
주소 오시는길
오시는길 한줄정보
한줄정보 상세설명
상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