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그렇게 절경일 수가 없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빼곡히 쌓인 논들이 금세 바다로 흘러내리기라도 할 듯 아슬하게 일렁이는 모습이 또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단다. 어딘고 하니, 바로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 45도 경사 비탈에 108개 층층계단, 680여 개의 논이 바다까지 흘러내린 독특한 지형 때문에 마치 남다른 비밀을 품은 보물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이름도 독특한 다랭이마을, ‘다랑이’를 사전에서 찾으면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따위에 있는 계단식의 좁고 긴 논배미’라는 해설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어감이 조금씩 변한 것인데, 어쨌거나 둥글둥글한 발음은 매한가지다. 여기 남해에서는 ‘다랭이’가 표준어인 셈이다. 이걸 딱 잘라 표현하자면 계단식 논이겠지만, 이곳은 그런 표현으로 한정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풍광을 간직하고 있다.
사실 계단식 논이야 어느 두메산골로 굽이쳐 들어가다 보면,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이토록 손바닥만한 논이 아주 반듯하게 언덕에서부터 저 아래 바다 끝까지 이어진 곳은 없었다. 그리고 논이든, 집이든, 길이든 모든 것이 바다를 향해 흘러내린 곳도 없다. 앞에도 말했다시피, 대부분의 계단식 논은 산속에 포근하게 둘러싸인 것이 일반적이다. 또 산허리를 따라 매끄럽게 구불거리는 곡선의 향연은 또 어떤가. 본래 미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모난 곳 없는 곡선이다. 뱀이 지나간 흔적처럼 어슬렁어슬렁, 굽이친 물결을 보고 있노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진달까. 정상까지,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내달리는 날카로움은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속도전’을 떠올리게 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다.
산비탈 등고선을 따른 지형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소박하게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사람들. 평수도 다양한 논들이 한 계단의 끝을 모두 채우면, 한 평이라도 더 논을 내려고 직각으로 곧추 세운 석축을 쌓아오던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그 구불구불한 길과 높은 경사 때문에, 여직 기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곳.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죽지 않고 머무르는 곳. 이곳에는 여유로운 삶, 느림의 미학이 깃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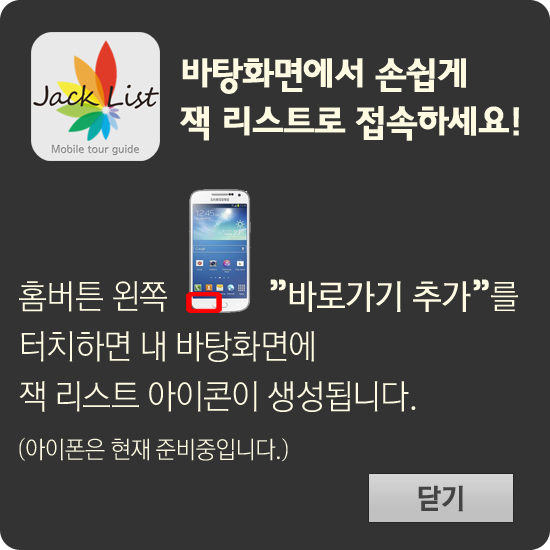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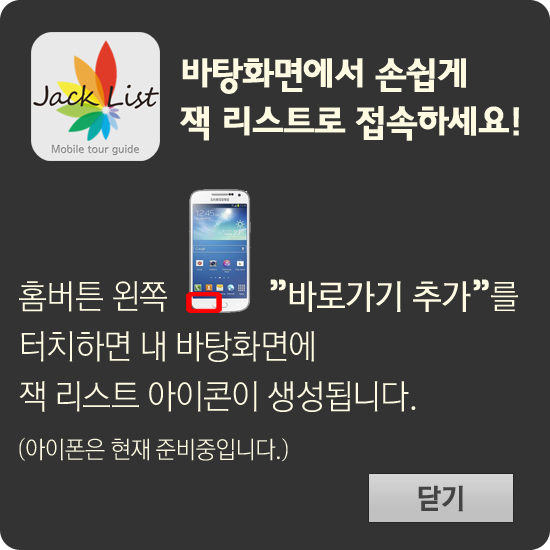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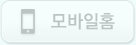

 주소
주소 오시는길
오시는길 한줄정보
한줄정보 상세설명
상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