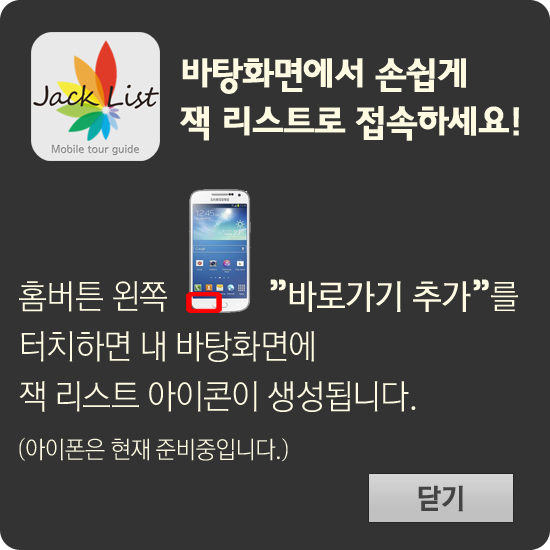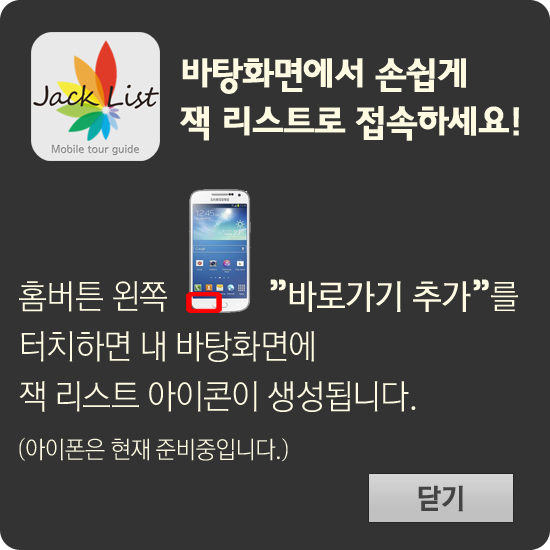밀감, 귤, 감귤…이름은 하나지만 별명은 서너 개인 감귤. 다른 과일들이 봄 무렵부터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 가을까지 줄기차게 수확을 맺는 동안에도 끈덕지게 푸르딩딩한 빛을 유지하다가 겨우내 매서운 칼바람에 스멀스멀 익어가는 도도한 과일이 바로 감귤이다. 그래서 날이 더 추워질수록 따뜻한 방 안에서 까먹는 귤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이 감귤, 하면 딱 떠오르는 고장. 제주는 감귤의 왕국이다.
먼저 감귤의 명칭과 뜻에 대한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두자. 감귤(柑橘)은 운향과 감귤나무아과 감귤속, 금감속, 탱자나무속의 과일을 총칭하는 단어다. 그러니 유자와 레몬, 자몽, 오렌지, 탱자 등도 모두 감귤인 셈. 한때 밀감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한 그 감귤을 정확히 지칭하는 듯해 많이 썼지만, 일본말의 ‘미깡’과 같다 하여 최근에는 사장(死藏)시킨 눈치다. 품종을 의미하는 ‘온주귤’이란 명칭이 더 정확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통용된 단어인 ‘감귤’이 우리 정서에는 더욱 잘 어울린다.
선사시대부터 우리 땅에서 자라왔던 감귤은 애초부터 제주와 남부 해안지대에서 흔히 자랐던 걸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제주 감귤이 왕가에 공물로 바쳐졌는가 하면, 조선시대에까지 왕가의 특별관리를 받았던 귀한 과일이었다. 왕가에서 따로 감귤나무를 관리하기 위해 제주로 관리를 파견하는가 하면 그 수확물을 모두 한양으로 보내 조선 왕가 식솔과 중앙관리들만 맛볼 수 있게 했다. 지금은 겨울 아랫목에서 만만하게 까먹거나 인심 좋게 나눠먹을 만큼 흔한 과일이지만 과거에는 이토록 귀했던 것.
현재는 따뜻한 기후를 가진 남쪽 지방 전역에 걸쳐 감귤이 대량 재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맛은 제주의 것처럼 좋지 못하다. 제주 역시 같은 섬 안이라도 기후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더욱 온화한 서귀포산 감귤을 최고로 친다. 그도 그럴 것이 서귀포 귤을 한 입 베어 물면 풍성한 과즙은 물론이고 탱탱한 과육의 식감, 그리고 적절한 신맛과 조화를 이룬 풍부한 당도는 가히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시중 마트에 납품되는 감귤들을 보면 우선 ‘때깔이 좋고 봐야한다’는 식의 장삿속 때문에 대부분 유통과정에서 왁스 코팅 작업을 동반한다. 푸른빛을 띤 감귤은 부러 상온에 며칠 더 익혔다가 코팅작업까지 거쳐 일단 겉보기에는 꽤 맛나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하여 그 때깔에 속아 구입했는데 의외로 싱겁고 신맛이라곤 하나도 없는 밍밍한 단맛만 입에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데 우리 서귀포 감귤은 앞선 그 때깔 좋은 감귤에 비해 조금은 투박한 모습이다. 푸른빛도 더 많이 돌고 표면도 좁쌀이 올라온 것처럼 거칠거칠하다. 그도 그럴 것이 서귀포산 감귤에는 특별한 치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맛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본래 민낯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화장과 치장에 집중하기 마련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