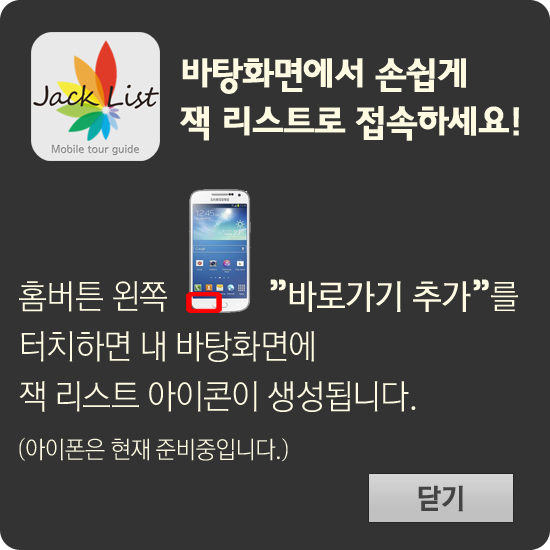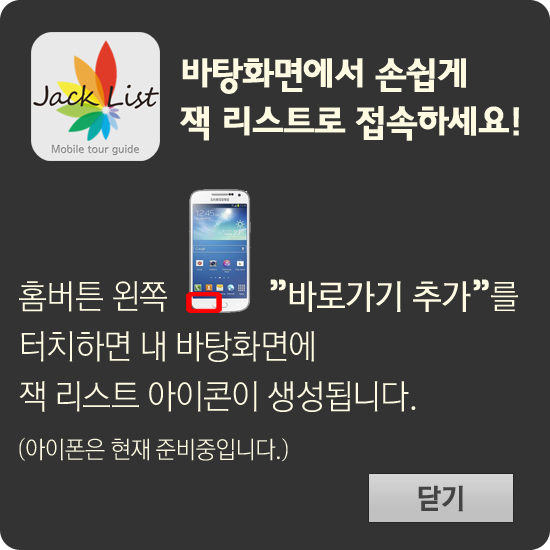한국 비빔밥 양대산맥
진주비빔밥
한국인의 비빔밥 사랑은 유별나다. 고문헌에서조차 비빔밥의 정확한 유래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지녔기도 하거니와, 일단 그 어디에서든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만만하기 때문이다. 본래 슴슴하게 조리한 신선한 채소와 제철 나물, 고추장, 계란프라이 등을 모두 곁들였을 때 비빔밥의 완벽한 모양새가 나오지만 사정에 따라 나물 한 두 가지, 계란 따위가 빠져도 어쨌든 그마저 모두 비빔밥으로 인정해주는 관용적인 음식이기도 하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처럼. 또 집에서 반찬이 시원찮거나 제사를 지낸 직후 나물만 잔뜩 쌓여있을 때 한데 모아 비벼버리기도 하니, 이 얼마나 속 시원한 음식인가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 비빔밥의 본고장은 어디일까, 라고 물으면 열에 여덟은 전주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전주가 비빔밥의 본고장이 맞긴 하지만, 비단 전주 하나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전주, 진주, 해주까지 삼주라 하여 비빔밥으로 이름깨나 날린 도시로 유명했지만 어느 순간, 전주가 한옥마을 마케팅과 함께 우리의 전통음식 비빔밥의 대명사처럼 유명해져 진주와 해주가 소외당했다.
한데 해주는 비빔밥보다는 냉면이 더 유명하고, 남은 진주가 전주와 함께 한국의 비빔밥 양대 지역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다. 푸릇하고 신선한 제철 야채를 삶거나 데쳐 올리고, 메인인 육회가 올라가고 국 종류가 따라 나가는 것까지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따로 ‘진주비빔밥’이라고 부른다. 진주비빔밥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1952년 임진왜란 당시에 격전지였던 진주성 전투에서 비빔밥이 유래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데 진주에는 1929년부터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진주비빔밥을 팔기 시작했던 노포들이 존재한다.
화려한 치장보다는
나물 하나하나까지 '꽉 찬' 맛이 중요하다
허나 생각보다 비빔밥의 비주얼은 그다지 화려하지 못하다. 꽃피우듯 밥이 보이지 않게 빼곡히 수놓인 나물들, 데코레이션의 화룡점정을 찍는 한가운데 육회와 계란 노른자까지 화려한 전주비빔밥의 비주얼에 비하면 나물과 육회, 고추장이 대강대강 올라간 진주의 비빔밥은 한편으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오히려 화려한 치장 없이 청순한 멋이 숨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색감과 윤기를 미루어보았을 때 육회와 나물의 선도가 꽤 좋아 보인다.
진주비빔밥은 전주와는 달리, 나물을 볶지 않고 대부분 살짝 데치거나 데친 후 가벼운 무침으로 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 모든 나물들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길이로 싹둑싹둑 잘라내는데, 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나뉘는 편이다. 입가에 잘 묻어나지 않고 젓가락으로 비비기 훨씬 쉽다는 점에서 자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나물은 기본적으로 콩나물과 숙주나물, 양배추나물, 무나물, 고사리, 속대기, 어린배추나물 등이 올라간다. 여기에 여름에는 따로 호박나물, 봄 가을철에는 살짝 데친 쪽파와 미나리, 겨울에는 단맛이 일품인 시금치와 부추가 제철나물로 첨가된다.
진가는 오히려 비비면서 나온다. 기름장에 고소하게 무쳐진 나물의 향이 진동을 한다. 육회와 함께 최상급으로 유지된 재료들의 선도가 입 안 가득 향긋하게 맴돈다. 다소 슴슴했던 첫맛이 씹을수록 입안에서 묘한 깊은 맛으로 번져간다. 역시 혼이 담긴 향토음식은 천천히, 오래 씹고 볼 일이다. 함께 나온 맑은 선짓국의 시원함은 또 어떤가! 다른 지역 비빔밥에 딸려나간 국들이 평이한 탕국에 그치는 반면, 진주에서는 특별히 선지가 들어간다. 진하지만 느끼함이 없고 담백하고 개운한 뒷맛이 일품이다. 비빔밥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