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년 세종 즉위 후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것으로 본래 이름은 수강궁이었다. 세종 원년에 태종이 잠시 거처했으며 이후로는 왕후 등 왕실의 어른들이 머물렀다. 유교 국가 조선의 ‘효’ 사상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장소였던 아담한 궁궐. 규모 면에서 다른 궁궐보다 작을지 모르나, 창경궁의 정전이나 국보 226호인 명정전은 현존하는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래되어 가치가 남다르다.
임진왜란 때 모든 전각이 전소되고 광해군대 재건되면서 지금의 창경궁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후로도 몇 차례 화재가 일어나면서 곡절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제의 패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1907년 순종이 즉위하자 일제는 그의 거처를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강제로 옮기게 한 후, 그를 위로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창경궁 내 주요 전각을 일제히 헐었다. 전각이 무너진 빈터에는 동물원과 일본식 박물관이 들어섰다. 그러면서 궐의 이름도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격하시켰다. 또 궐내 일본의 국화인 벚나무를 심어 1924년부터는 조선의 궁궐 안에서 왜국의 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봐야만 했다.
한편, 창경궁은 역사 속 유명한 이야기를 품고 있기도 하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최후를 맞이한 곳은 이곳 창경궁 내 취선당, 그리고 영조에 의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곳도 궐내 선인문 안뜰이었다.
창경궁은 경희궁과 함께 일제에 의해 가장 훼손을 많이 당한 궁궐이다. 화재나 전쟁으로 인한 소실은 유적지의 숙명과도 다름없으니 차치하지만,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용도 변경되고 궁궐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 멋스러운 궁궐이 한때는 유원지이고 동물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당시 조선왕실로서는 능욕도 그런 능욕이 없었을 것. 지금은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상처는 곳곳에 남아있다. 그래서 더 애틋한 궁궐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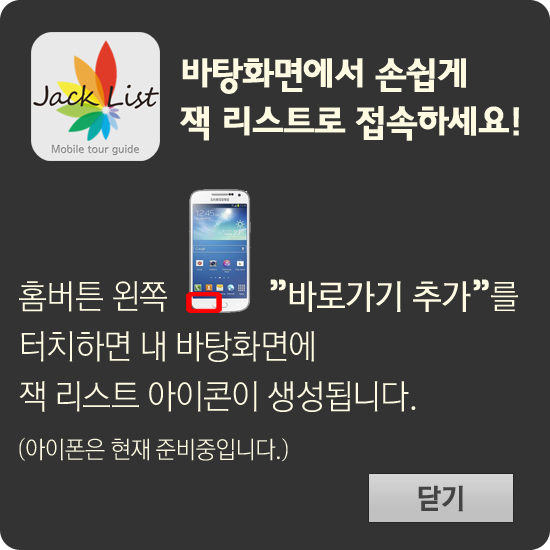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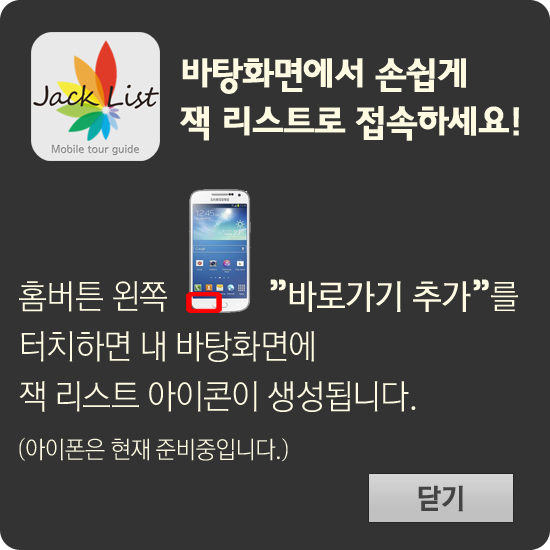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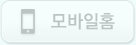

 주소
주소 오시는길
오시는길 한줄정보
한줄정보 상세설명
상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