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압지에서 분황사로 넘어가는 길목 저편, 많은 돌들이 구슬처럼 듬성듬성 박힌 빈터. 한때 동양에서 가장 큰 절이었다는 황룡사가 있던 자리에는 동서 288미터, 남북 281미터로 약 3만여 평에 달하는 넓은 터를 메우고 있던 신라의 보물이 보이는듯하다. 지금은 바람만 남은 쓸쓸한 터에서 찬란했던 역사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황룡사 터는 본래 진흥왕이 늪지를 메워 궁궐을 지으려 했던 곳이다. 그런데 늪지에서 돌연 황룡이 나타나자 궁궐 건축을 중단하고, 절을 짓기 시작해 17년 만에 완성한 것이다. 이름은 당연히 유래에 연유해, 황룡사가 된 것.
그 후 선덕여왕 재위 시절, 당나라에서 막 귀국한 자장 율사는 “신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구층 목탑을 세울 것”을 아뢴다. 이를 허락한 선덕여왕의 아낌없는 지원 하에, 백제의 기술자인 아비지와 신라의 용춘이 수많은 장인들과 함께 건축을 시작했다. 바닥의 면적만 한 면의 길이가 22미터, 전체 높이 8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목탑. 결국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으로 모두 전소되어, 지금은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비만 홀로 남겨져있다. 하지만 웅장한 탑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여러 나라의 스님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보물이었다.
그 자리에 우뚝 솟아, 지금의 경주 시내를 내려보았을 목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또 다른 생명이 자란다. 찬란한 봄이 오면 이곳은 만개하는 유채꽃으로 한바탕 진한 노랑의 물결을 이룬다. 고흐가 생전에 도달하려 했던 ‘노랑의 음표’처럼 흐드러진 꽃 풍경에 정신이 아득해져 올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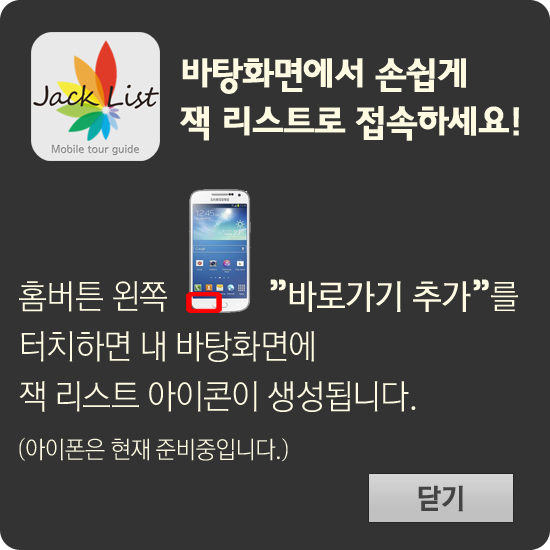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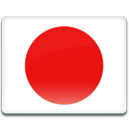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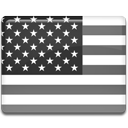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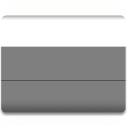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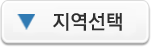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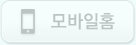

 주소
주소 오시는길
오시는길 상세설명
상세설명







